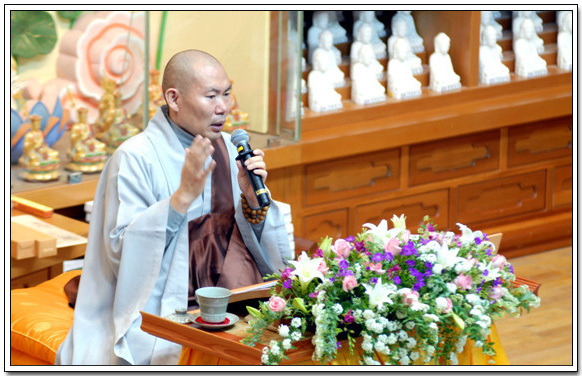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명심보감이라 하면 다분히 유교적 색채만을띤 교양서라고 떠올린다. 하지만 명심보감의 내용을 보면 유교는 물론이거니와 불교, 도교의 동양사상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명심보감은 동양의 여러 고전에서 뽑은 명언을 집적(集積)한 ‘수신교양서(修身敎養書)’라고 봄이 옳을 듯하다. 갖추어야 할 교양과 심성, 윤리도덕 및 처세에 관한 평범한 진리를 통해 삶의 지혜를 깨우쳐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읽힌 명심보감은 고려말 예문관제학을 지낸 추적(秋適)이 중국 고전에서 보배로운 말이나 글 163항목을 가려 뽑아 엮어 편찬한 ‘명심보감초(明心寶鑑抄)’이다. 명심보감의 편저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의견이 분분하다. 명심보감은 목판본, 석판본 등 10여 종의 여러 판본이 있는데 간행된 명심보감의 주요 판본版本을 조사해본 결과, 중국 명나라의 범립본(范立本)을 저자로 표시한 판본이 1종(種), 고려의 추적을 저자라고 주장한 판본이 2종(種), 저자의 표시가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는 판본이 8종(種) 등으로 우리의 것을 찾으려는 학계일각에서는 보다 명확한 고증자료를 찾아 추적이 원 편저자임을 밝히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명심보감은 우리나라의 사오백 년 정도의 세월에 걸쳐 가장 많이 읽혀진 책 중의 하나로서 조선시대 서당에서 천자문을 익힌 아동을 대상으로 동몽선습과 함께 기초과정의 한문교습서로 사용되었다. 명심보감의 발문(跋文)에 보면 이율곡의 글이 다음과 같이 남아 있다. “지난 겨울에 가친(家親)께서 영남에서 돌아오실 적에 책 한 권을 가져오셨는데 내가 재삼 펴 읽고 팔을 치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그 책이 명심보감이다.”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모아 놓은 책이 있다니…….” 하면서 매우 기뻐했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다. 차례를 보면 계선편, 천명편, 순명편부터 부행편까지 20편이고 그 뒤로 5편이 추가 되어 있다. 원본에 없는 그 5편은 많은 시간을 두며 계속해서 발췌된 것을 편집한 것이다. 명심보감은 여러 글에서 뽑아 엮은 책으로 그 글의 출처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므로 만약 불교에서 인용할 더욱 좋은 문구가 있으면 뒤에 추가시켜 넣으면 된다. 오랜 세월을 거쳐 편집된 특성을 갖춘 책이다 보니, 책 내용 중 군데군데 서로 상충하는 문장들도 있다. 현재 이 명심보감은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본의 책을 총망라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명심보감은 일종의 수신서로서 교양 면에서도 대단히 필요한 내용이다.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부분은 불교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상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런 것을 받아들인 이가 막상 불교공부를 접했을 때 명심보감에서 보아왔던 유교적인 고정된 시각으로 우리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책을 통해 그러한 것을 수정하고, 우리 모두가 단순히 모범적인 삶의 모방이나 행동양식의 답습이 아닌 마음 자성의 자리를 밝혀 자각하여 보다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견인차구실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기획했다. 바로 이 점이 이 책이 나오게 된 이유이며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명심보감을 통해서 각각의 사상들이 불교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시각의 차이가 있다면 재해석을 통해 불교적 안목을 더욱 키우고, 또한 불교적 사상과 잘 들어맞는 부분은 되새김하며 자기 것으로 익히는 데 힘을 기울여야겠다. 이러한 작업은 불교공부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명심보감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사랑을 받아온 책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그 유명세만큼 내용을 완전히 다 읽어 본 이는 아마 드물 것이다. 이번 불교대학 특강 기회에 이 명심보감 한 권만 자세히 훑어보더라도 우리 인생에 커다란 수확이 되리라고 본다. 이 내용은 십수 회 강의로 끝내기에는 적지 않은 분량이나 명심보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본다는 입장에서는 대단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會主 無一 우학 合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