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일반뉴스 |
 |
|
강화 '교동도'에서 만난 조선조 '찜질방'
2015.05.03 | 정진해 문화재전문기자

강화도와 교동도를 연결하는 교동 연육교가 2014년 7월 1일 개통되면서 그동안 배를 이용하여 강화 창후리항과 교동도 월선포선착장으로 오가던 여객선은 선착장 멀리 밧줄에 묶인 채 갈 길을 잃고 말았다. 북적거리던 선착장과 주차장, 어물점은 썰렁한 바닷바람만 불어올 뿐이다.
| ▲ 교동향교(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8호) © 정진해 |
|
문화재명 : 교동향교(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8호)
교동읍성(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3호)
연산군적거지(강화군 향토유적 제28호)
화계산봉수대(강화군 향토유적 제29호
고구리산성지(강화군 향토유적 제 30호)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일대
교동이라는 이름은 고구려에서 고목근현(高木根縣)라 하였고,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교동(喬桐)이라 지명을 정할 때는 이 섬에 오동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데서 붙어진 지명이다. 교동도 하면 조선의 10대 왕 연산군과 25대 철종이다.
연산군이 폐위되어 강화로 유배 와서 두 달 만에 죽었고, 그의 부인도 이곳에서 명을 마쳤다. 철종은 13세 나이로 교동도 읍내리에서 유거하다가 강화로 가서 왕이 되어 즉위하였다. 교동도는 왕족의 유배지였다면, 전남 해남 지역은 선비들의 유배지였다. 고려 21대 왕 희종부터 조선시대 임해군, 능창대군 등 11명의 왕족이 이곳 교동도에서 유배생활을 했다.
| ▲ 교동읍성(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3호) © 정진해 |
|
교동읍성(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3호), 남문인 홍예 틀만 남은 읍성은 조선 인조 7년(1629년) 이곳에 영이 설치될 때 축조된 것으로 옹성 3곳과 치첩 4곳이 있고 둘레는 동문(통삼루), 북문(공북루), 남문(유량루)이 있었다.
순조 13년(1812년)에 통어사 백동원이 치첩을 수축하고 고종 21년(1883년)에 방어사 백동윤이 남문을 중건하였는데, 1921년의 폭풍우로 남문루는 없어지고 현재는 아치형의 남만이 남아있던 것을 1982년에 붕괴한 남문(아치형)과 치첩을 보수하여 원형은 되찾았다.
| ▲ 연산군적거지(강화군 향토유적 제28호) © 정진해 |
|
읍성 내에는 객사 터인 교동부지와 안해루의 석주 2개, 계단 20여 개가 남았는데, 석주 2개는 교동초등학교에 옮겨져 있다. 부지는 삼도(경기·황해·충청) 수군어영을 관장하던 본영으로 조선 인조 7년(1629)에 남양의 화량진을 옮겨 경기수영이 교동 읍내리에 설치되고 교동현은 교동부로 승격된 후 설치되었다.
| ▲ 화계산봉수대 (강화군 향토유적 제29호) © 정진해 |
|
남문 앞 남산포선착장은 삼도수군통어영 소속의 전함이 정박하던 곳이다. 썰물 때면 당시의 석축이 모습을 드러내고, 또한 함정을 묶어두던 계류석이 남아 있다. 선착장 옆 산에는 중국 사신들이 이곳 교동에 잠시 머물다 가면서 항해의 무사태평을 빌었던 사당이 남아 있다.
읍성 내에 사각형의 우물 속에 죽어 있는 오동나무가 모습을 드러낸다. 바위 위쪽에는 ‘연산군 적거지’라는 표석이 있다. 가까이에는 연산군과 폐비 신씨를 모신 사당인 부근당이 북쪽 성벽 안쪽에 자리하고, 성벽과 함께해온 350년 나이의 느티나무가 읍성을 대표하여 지금도 터전을 지키고 있다.
| ▲ 고구리산성지(강화군 향토유적 제 30호) © 정진해 |
|
교동향교로 가는 길목에 선정비와 불망비를 모아두었으며, 화개산 아래 자리 잡은 교동향교는 고려 인종 5년(1127년) 때 각주에 향교가 세워졌을 때 화개산 북쪽인 고구리 향교에 세워졌으며 교동읍이 읍내리로 옮겨짐에 따라 부사 조호신이 영조 17년(1741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건물로 대성전, 동서무, 명륜당, 동재, 서재, 제기고 등이 있다. 고려 충렬왕 12년(1286)에 안향이 원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최초로 공자상을 들여와 모셨다고 전하며, 이후 지방의 각 군현에 성현의 위패를 모시는 문묘를 설치하였다.
교동도에는 4개의 사찰이 있었으나, 모두 없어지고 지금은 화개사 만이 남아 있다. 화개산 북쪽에 갈공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절에 목은 이색 선생이 수양하였다고 전한다. 정상 능선에는 옛 사람들이 소원을 빌기 위한 바위에 성혈의 흔적과 제4봉수로인 평안북도 의주를 출발하여 서해안을 따라 순안, 해주, 연평도, 교동도를 거쳐 서울의 목멱산에 이르는 화계봉수대가 있다. 덕산봉수에서 신호를 받아 하음 봉천산 봉수로 연결되는 역할을 하였다.
화개산성(향토유적 제30호)은 정상에서 고구리 방향과 상룡리로 이어진다. 이 산성은 해상에서 적을 격파하지 못하였을 경우를 대비한 육상 예비진지의 역할도 겸한 것으로, 영조 13년(1737년)에 이르러 개축하면서 돌로 쌓았는데 성안에 연못이 하나, 샘 하나, 군창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샘터만 남아 있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한증막은 황토와 돌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찜질방의 근원이자 옛 형태이다. 4~5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소나무 가지 등을 이용해 불을 지펴 그 열기로 한증을 하였던 목욕시설이다.
이 시설은 조선후기의 것으로는 최대의 크기이지만 아직 문화재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증막 옆에는 ‘연산군 유배지’라고 하는 최근에 만든 표석이 자리하고 있다. 아직 주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산군이 유배 생활을 하였을 건물터와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교동도는 왕족의 유배지이면서, 역사의 현장이다. 또한 쌀의 곡창지이면서,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터이기도 하다. 일찍 이곳을 찾은 조선의 선비들은 자연의 아름다음을 노래하였다.
앞으로 교동도의 과제는 체계적으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교동도는 역사와 농촌체험의 산교육장이 될 것이다. 아직 눈에 보이면서도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된 많은 유물과 유적이 일정한 틀 속에서 관리되는 날이 왔으면 한다.
|
<ⓒ참좋은인연신문사 &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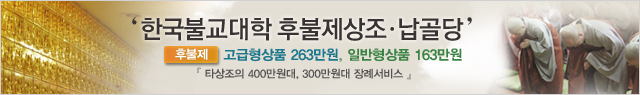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