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일반뉴스 |
 |
|
조형과 조각수법에 정중함 스며있는 ‘고달사지’
2015.04.23 | 정진해 문화재전문기자

경기도 이천시 북내면 상교리 혜목산 안골에 자리 잡고 있는 고달사지는 발굴조사가 끝난 상태에 건물지가 잘 정리되어 있다. 시원하게 트인 동쪽을 제외하고는 삼면이 산봉들로 미끄러지듯 둘러져 있어 아늑한 느낌이 든다.
남한강변에는 청룡사, 거돈사, 법천사, 흥법사 등 대규모 사찰이 있는데, 고달사도 그 중의 하나로 신라 경덕왕 23년(764)에 창건되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아직 당시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려 광종 이후 역대 왕들의 보호 하에 전성기를 맞았다. 고려 시대 당시만 해도 사방 30리가 모두사찰의 땅이었으나 어느 시기에 폐사되었는지 알려지지 않는다.
고달사는 구산선문 중 봉림산파의 선찰이면서 고달선원으로 불렸다. 봉림선문을 개창한 진경대사 심희는 고달사에 주석한 고승 원감국사 현욱의 법통을 이어받은 제자였다. 현욱은 문성왕 2년(840)에 거처를 여주 혜목산 고달사로 옮겨 선풍을 떨치다가 경문왕 9년(869)에 입적하였다. 경문왕은 그를 원감화상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진경대사는 원종대사 찬유에게 법통을 잇게 하니 원종대사는 고달선원의 제3대 정신적 지주가 된다.
원감 현욱 선사(787~868)는 진골출신으로 38세 때 당나라 역거사에서 수도 정진하다가 희강왕 2년(837)에 귀국하여 남악(지리사) 실상사, 무주(광주) 등에 머무르다가 고달사에서 여생을 마쳤다.
원종 혜진 대사(869~958년)는 헌강왕 8년(882)에 승려가 되어 상주 삼랑사 융제 선사 및 요예 선사의 제자가 되었고, 진성여왕 5년(891) 삼각산 장의사(서울 평창동)에서 구족계를 받고 이듬해 중국 서주 동성현 적주산에서 자선 선사로부터 법을 받았다. 경명왕 5년(921)에 귀국하여 봉림사, 천왕사에서 머물다, 고려 정종 때 국사가 되었으며, 광종 9년(958) 8월에 고달사에서 입적하였다. 왕은 ‘원종대사 혜진’이라 추시하고 진영을 그리게 하였다.
잘 정리된 사지에는 빼곡히 들어섰던 건물터의 흔적을 빠짐없이 표시해 두었고, 그 일정한 공간에 석조물이 남아 있다. 주차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온전히 남아 있는 석조가 있다. 이 석조는 건물 내에 두었던 것으로, 승려들이 물을 담아 두거나 곡물을 씻을 때, 몸을 청결히 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석조는 바닥만 남고 모두 파손되어 있으나 같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한다.
건물지의 중앙에 해당되는 곳에 석불좌(보물 제8호)가 자리하고 있다. 주변에는 주춧돌이 원좌의 기둥굄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조각 솜씨가 뛰어나다. 사각의 대좌는 거대한 크기이면서도 유연한 느낌을 주는 것은 율동적이면서 팽창감이 느껴지는 연꽃잎의 묘사 때문이다. 하대석과 상대석에는 각각 복련과 앙련을 두르고, 중대석에는 각 면에 연꽃을 측면에서 보았을 때의 연꽃을 조각하였다. 이러한 연꽃의 배열은 고려시대의 양식상 공통된 특징을 갖는다.
석불좌와 가까이 있는 원종대사 혜진탑비(보물 제6호)는 우리나라 탑비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원종대사가 90세로 입적하고, 17년 후인 광종 26년(975)에 탑비가 조성되었다. 거북의 머리는 험상궂은 용의 머리에 가깝고, 목이 짧고 앞을 똑 바로 주시하고 있는 눈은 눈꼬리가 길게 치켜 올라가 있다. 등에는 이중의 6각형의 귀갑문이 조각되어 있으며, 중앙부로 가면서 소용돌이치는 구름을 생동감 있게 새겼고, 비좌를 돌출시키고 겹연꽃을 둘렸다.
비신은 1915년에 넘어져 8조각으로 깨어진 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으며, 2014년 8월에 비신을 복제하여 원래 높이로 복원하였다. 이수는 정면 중앙에는 전서체로 ‘원종국사’라 명기 하였고, 두 마리의 용이 명기를 보고 있으며, 좌우 두 마리의 용은 바깥쪽을 보고 있다. 전체적인 모습은 4마리의 용이 구름과 함께 생동감 넘치게 표현되었다. 밑면에는 연꽃을 두르고 층급을 두었다.
탑비에서 약 200m 뒤쪽에 자리한 고달사지 부도(국보 제4호)는 누구의 승탑인지 확실치 않으나 원감 현욱선사의 묘탑으로 보고 있다. 팔각원당형을 따른 걸작으로 정제된 조형과 세련된 조법으로 장중한 멋을 발산한 승탑이다. 지대석은 여러 개 돌을 팔각으로 짜 맞추고 그 위에 팔각의 하대석을 두고, 각 면에 연꽃측면문양을 새기고 안쪽에 구름문양을 새겼다. 하대석 위에는 복엽의 복련을 둘렸다. 중대석은 입체적으로 두 마리의 거북을 사이에 두고 용 4마리가 구름 속을 회유하는 모습으로 조각하였다. 몸돌에는 문비와 사천왕상을 새겼으며, 지붕돌은 각 모서리 끝에 귀꽃을 조각하였으며, 추녀에는 구름과 천인상을 새겨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상륜부는 보개를 올렸다.
고달사지 부도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원종대사 혜진탑이 자리하고 있다. 고려 경종 2년(977)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각의 기단부를 제외한 부분은 팔각을 기본으로 한 승탑이다. 하대석은 4개의 돌로 사각으로 짜 맞추고 그 위에 연꽃을 새겼다. 중대석은 윗부분에 8각의 띠를 두르고, 바로 아래에는 거북이가 몸을 앞으로 두고 머리는 서쪽을 향하고, 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용 4마리가 구름 속을 회유하는 모습을 새겼다. 상대석은 앙련을 둘렀다. 몸돌의 4면에는 문 모양이, 다른 4면에는 사천왕입상을 새겼다. 지붕돌의 각 면 끝에는 귀꽃을 새겼고, 상륜부에는 지붕돌을 축소한 모습이다.
고달사지 쌍사자석등(보물 제282호)은 1959년에 경복궁으로 옮겨졌다가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 하면서 현재 옥외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다.
정제된 조형과 세련된 조각 수법에서 정중함을 엿볼 수 있는 고려 초기의 걸작이 산재된 곳, 아직도 고달사지를 떠나 있는 석재물 문화재는 원래 위치에 배치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한다. 특히 건조물은 기존에 놓여있던 장소를 떠나 있으면 역사적, 학술적 가치면에서 반감된다고 하였다. 문화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원래의 위치에서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 ▲ 석불좌 : 연꽃으로 둘러진 연화대 © 정진해 |
|
| ▲ 원종대사 혜진탑비: 2014년 8월에 비신이 복원된 모습 © 정진해 |
|
| ▲ 고달사지 부도 : 부도탑의 주인공을 알 수 없는 걸작 © 정진해 |
|
문화재명 : 고달사지(사적 제382호)
고달사지 부도(국보 제4호)
원종대사 혜진탑비(보물 제6호)
원종대사 혜진탑(보물 제7호)
석불좌(보물 제8호)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북내면 상교리
|
|
<ⓒ참좋은인연신문사 &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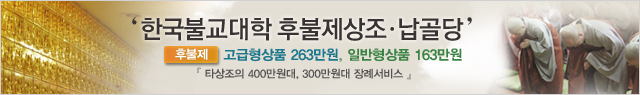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