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일반뉴스 |
 |
|
거울같이 해맑은 잔잔한 호수에 비친 ‘해운정’
2015.10.11 | 정진해 문화재전문기자

문화재 : 강릉 해운정 (보물 제183호)
소재지 : 강원 강릉시 운정길 125 (운정동)
| ▲ 강릉 해운정 솟을대문. ©정진해 문화재전문위원 | |
[한국NGO신문] 정진해 문화재전문기자 = 강릉을 여행하는 사람 중에 왜 강릉에는 누정 건축물이 많을까 하는 이야기를 한다. 강릉 시내와 경포호 주변을 돌아보면 곳곳에 전통 건축물을 보게 된다. 누정 건물뿐만 아니라 초가집, 사당, 가옥, 향교, 관공서 건물에 이르기까지 옥외 목재건축 박물관이라 하면 정확할 것 같다.
목조 건물 중 강릉의 누정 중 보물 제183호로 지정된 해운정을 찾아 떠났다. 강릉시 운정동에 자리 잡은 정자는 옛 경포호 변의 낮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건물이다. 주변의 많은 변화로 원래의 높이보다 낮게 일반 가족의 높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넓은 주차장에 솟을대문과 해운정의 편액을 단 정자와 주변에 둘러 있는 담이 전부이다.
경포호는 예부터 많은 명사가 찾아와 시를 읊고 그림을 그렸던 곳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경치를 가졌던 곳이다. 지금도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경치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노송, 그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누정은 열두 계절의 병풍이 둘러쳐져 있는 것 같이 아름답다. 많은 정자 중에 해운정을 찾아 옛 정취를 느껴보고자 한다.
경포호 주변에는 경포대를 비롯해 해운정, 방해정, 금란정, 경호정 등 1대 11정이 경치 좋은 곳에 있다. 정자라고 하면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룻바닥을 지면에서 한층 높게 지은 다락식의 건물을 일컫는데, 이를 누각과 함께 정루라고도 부른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누정조에 의하면, 누(樓)·정(亭)·당(堂)·대(臺)·각(閣)·헌(軒) 등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누각은 대개 경포대처럼 높은 언덕이나 돌 혹은 흙을 쌓아올린 대 위에 세운다고 하여 대각 또는 누대라고도 부른다.
| ▲ 강릉 해운정 전경. ©정진해 문화재전문위원 | |
누정은 남성의 공간으로 자연을 배경으로 유람이나 휴식공간으로 특별히 지은 건축물이다. 원래 누정에는 방이 없이 마루만 있고 사방이 확 트여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 건립하는 것이 특색이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정자가 바로 해운정(海雲亭)이다.
해운정(海雲亭)은 높은 언덕이나 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옥과 사랑채처럼 평지에서 약간 올려 지은 건물이다. 솟을대문을 둔 정자는 사방이 개방되어야 하나 해운정은 사방이 트인 건물이 아니다. 정자에는 대문이 필요치 않는데, 해운정에는 대문이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3단으로 이루어진 축대 위에 정자가 자리하고 있다.
이 정자는 조선 중종 25년(1530)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했던 어촌 심언광이 별당으로 지은 건물이다. 건물의 구조 하나하나에는 전통의 멋이 배어있고, 선비의 정신이 담겨있는 건물이다. 솟을대문은 정년 3칸 측면 2칸의 건물이다.
| ▲ 강릉 해운정 현판. ©정진해 문화재전문위원 | |
출입문은 솟을문이고 좌우의 한 칸씩은 눈꼽창보다 조금 큰 두 짝의 띠살문을 달아 여닫을 수 있도록 하였다. 판자로 만들어진 문은 두 짝을 달았고 그 위에는 15개의 살창을 꽂은 홍살문을 두었다. 홍살문은 궁전, 관아, 사당, 장려 등 신성한 장소에 설치하여 잡귀의 침입을 막는 기능을 하는데, 이곳의 홍살문도 그러한 기능을 위해 만든 것 같다.
그러나 서원이나 향교, 묘 등에 세운 홍살문은 이곳에서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경건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표시의 문으로도 기능을 갖는데, 조선조에는 의부, 절부(열려) 등에게도 내려져 효행과 여성의 절개를 중시하는 정책의 하나로 사용하였다.
해운정 솟을대문의 홍살문에는 붉은색으로 칠하지 않았다. 경건함 또는 효행 등의 의미보다 잡귀의 침입이 우선시 된 듯하다. 그러나 손님이 찾아올 때는 문밖에서 옷차림을 바로 하고 경건한 자세로 대문을 들어와야 주인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을 듯 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곳을 드나들 때만 홍살문을 확인하지 않는다.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마당이 펼쳐진다. 그리고 앞에 높은 기단 위에 단정하게 보이는 건물을 보는 순간 선비의 이상이 담겨 있는 듯 단정한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사방으로 담이 둘러 있고 노송 한 그루가 담 너머에서 가지를 해운정 방향으로 뻗고 있다.
| ▲ 강릉 해운정 대청 판문. ©정진해 문화재전문위원 | |
명사들이 각박한 현실을 피하여 산수가 아름다운 자연이 좋아 찾아온 장소
1단의 기단은 자연석으로 쌓고 그 위에 꽃나무를 심었고, 2단의 기단은 다듬은 돌로 기단을 쌓고 그 위에 꽃나무와 초본류를 심었다. 3단의 기단석은 다듬은 장대석을 쌓고 그 위에 자연석의 주초석을 놓고 건물을 세웠다.
기단 중간에 계단을 두었으며, 각 문 앞에는 댓돌을 놓아 마루에 오르기 쉽도록 하였다. 문지방 아래 바깥은 툇마루를 돌렸다. 건물 정면은 3칸, 측면 2칸의 홑처마의 팔작지붕을 하였으며, 건물 평면은 4칸의 대청과 1칸의 온돌방을 앞뒤로 배치하였다.
그 사이에 사잇장지를 드린 일자 형태를 하고 띠고 있다. 기둥 윗몸은 창방으로 결구하고 주도를 올린 초익공 건물이다. 굴도리는 장혀가 받치고 다시 이를 소로가 칸마다 3개씩 받치고 있다. 정면의 대청마루의 2칸에는 궁판이 있는 띠살 4분합문을 달았고, 서까래 끝에 들쇠에 매달 수 있게 하였다. 방이 있는 한 칸은 벽 안쪽에 문틀을 끼우고 두 짝 여닫이 세살문+용자 창호로 달았다.
각 칸의 창방 위쪽에는 영기문을 판 머름청판을 끼워 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청의 좌측과 뒤의 창호에는 창문울거미의 중앙에 수직으로 선대를 하나씩 세웠고 좌우로 판만을 각각 한 짝씩 달았다.
| ▲ 강릉 해운정 경호어촌 편액. ©정진해 문화재전문위원 | |
방이 있는 서쪽 편에는 방마다 띠살문 한 짝씩 달았다. 특이한 것은 앞쪽에 있는 방의 문과 뒤쪽에 있는 방의 문은 전체적인 모습은 같으나 뒷방의 문에 띠살의 칸 수는 7층으로 이루어졌지만 앞방의 띠살문은 4층으로 띠를 만들고 밑에는 궁판을 달았다. 어떤 의미로 다른 모양의 문을 달았는지는 알 수 없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먼저 온돌방은 장판지마감과 바닥과 종이 마감의 벽과 천장으로 되어 있다. 합각 및 천장은 귀틀을 짜서 우물천장으로 마감하였고, 대청은 우물마루바닥이고 천장은 서까래가 노출된 연등천장으로 마감하였다. 가구는 5량으로 앞뒤 평주에 대들보를 걸고 위에 간단한 포대공을 올려 종보를 걸었다. 위에는 단초무늬가 새겨진 판대공을 세워 마룻대(종도리)를 받쳤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건물 밖에는 ‘해운정(海雲亭)’의 현판이 걸려 있다. 이곳에 당시에는 유명 인사들이 이곳을 찾아 어촌 심언광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맺었을 것이고, 후대에 이어 오면서 많은 선비가 찾은 것 같다. 특히 해운정을 쓴 우암 송시열도 이곳을 찾아 건물의 이름을 지어 붙일 만큼의 관계가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동해시 추암동에 해암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 ▲ 강릉 해운정 해운소정 편액. ©정진해 문화재전문위원 | |
이 정자는 삼척 심씨의 시조인 심동로가 벼슬을 버리고 내려와 제자를 가르치며 생활할 때 지은 정자로 고려 공민왕 10년(1361)에 처음 짓고, 조선 중종 25년(1530)에 심언광이 다시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우암 송시열이 덕원으로 유배되어 가는 도중 이곳에 들려 ‘초합운심경전사((草合雲深逕轉斜)’라는 글을 남긴 것이 있다. 이때 경포의 해운정과 추암의 해암정의 현판을 쓰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내부에는 많은 편액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 큰 글씨로 ‘경호어촌(鏡湖漁村)’과 ‘해운소정’이 눈에 들어온다. 이 글씨는 어촌공이 중종 32년(1537) 이조판서 재임 때 명나라 정사 상공용과 부사 오희맹이 사신으로 왔을 때 이들을 맞이하여 안내하는 관반사로 임명되어 그들과 교류하며 시를 주고받을 정도로 시문에 뛰어났다.
| ▲ 강릉 해운정 각종 편액. ©정진해 문화재전문위원 | |
이때 두 사신은 어촌공의 안내로 이곳 강릉으로 내려와 별당이었던 이곳을 들려 공용경은 ‘경호어촌(鏡湖漁村)’이라는 편액과 화선에 ‘오언율시(五言律詩)’를 써 주었으며, 부사 오희맹은 ‘해운소정(海雲小亭)’이라는 편액과 환선에다 두절의 시를 써서 기증하였다고 한다.
어촌공은 해운정을 짓고, 8년 후에 해운정 서쪽에 ‘망서당(望西堂)‘을 지어 대궐을 바라보며 임금을 그리는 마음을 여생을 보내고자 했을 것이다. 어촌공은 망서당(望西堂)에서 임금을 그리는 시를 남겼다.
一上高亭望百面/ 雲海隔瑤臺/ 此身永負承明謁/ 猶幸終南入夢來
정자에 한번 올라 백번을 바라보니/아득히 먼 궁궐은 구름에 가렸구나
이 몸은 영원히 임금에게 매인 몸/ 다행히 종남산을 꿈에서 볼 줄이야.
망서당은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얼굴이었던 망서당 현판만 해운정에 남아있다. 많은 편액은 공용경, 오희맹, 이이, 송시열, 송익필 등 유명 인사들이 지은 시 40수 걸어져 있다. 해운정 주변의 경치를 읊거나 어촌공의 행적을 기리는 시, 해운정을 찾았던 유명 인사들의 시 등이 있는데, 이 중 명나라 사신 공용경(龔用卿)의 시 한 수를 읊어본다.
‘湖水平如鏡/ 冥冥滄海通/ 潮光迷岸白/ 漁火射波鴻/ 依檻看歸鳥/ 臨磯數去鴻/ 村居原自得/ 知是對鷗翁 거울같이 해맑은 잔잔한 호수/ 아스라이 바다로 흘러가니/ 호수 빛 되비치어 언덕은 뿌옇구나/ 고기잡이배 불빛은 파도를 타고/ 난간에 기대어 새들을 보고/ 기슭에 이르니 기러기 나네/ 시골에 머물며 얻는 것 많아/ 갈매기야 늙은이의 뜻을 알테지’
| ▲ 강릉 해운정에 보관 중인 망서당 편액. ©문화재 전문위원 | |
대청에 앉아 앞을 바라보면 잔잔한 호수, 나르던 갈매기가 보였던 그곳엔 들판이 펼쳐져 있고 자동차가 오가는 도로가 가로 놓였다. 계단을 내려오며 좌우로 화들짝 피어 있는 꽃들의 모습은 어쩌면 정겨움이 떠나있는 듯 느껴진다.
외국에서 들어온 원예종 식물이 꽃을 피우고 있었다. 우리의 전통한옥 곁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맥을 끊지 않고 살아온 나무와 화초가 꽃을 피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자를 찾았던 명사들은 각박한 현실을 피하여 산수가 아름다운 자연이 좋아 찾아온 장소였다. 이곳에서 정신적 즐거움을 찾고 위대한 자연을 배우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았을까 한다.
|
<ⓒ참좋은인연신문사 &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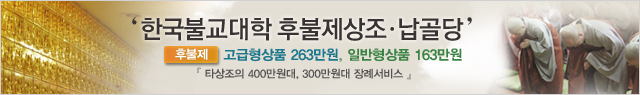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