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불교뉴스 |
 |
|
가을! 경포호 바라보며 시 한 수 읊어보세
2015.09.28 | 정진해 문화재전문기자

문화재 :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명승 제108호)
강릉경포대(강원도유형문화재 제6호)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저동 94
[한국NGO신문] 정진해 문화재전문기자 = 강릉시 저동에 불쑥 솟구친 곳에 자라잡은 경포대, 이곳은 관동팔경 중의 한 곳이다. 대에 올라 바라보는 동해의 일출과 돛단배가 오가던 바다, 하얀 백사장, 경포호의 풍경을 막힘없이 바라보던 곳, 많은 묵객이 이곳에 앉아 시를 읊고, 그림을 그렸고 달을 헤아리던 장소였다.
경포대를 이야기 하면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경포대는 강릉을 상징하는 대표적 관광의 명소이다. 고려말 충숙왕 13년인 1326년에 지충추부사로 있던 박숙이 방해정 뒷산의 인월사터에 세웠던 것을 1508년 강릉부사 한급(韓汲)이 경포호변에 우뚝 솟아 있는 산 정상에 건물을 옮겨 세우면서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안축의 「鏡浦臺新亭記」記文에 의하면 "옛날 영랑선인이 놀던 곳이며 정자가 없어 비바람이 치는 날 놀러왔던 사람들이 곤욕스럽게 여겨 작은 정자를 지었다"라고 하여 창건목적을 밝히고 있다.
처음 이곳에 경포대 건물을 지을 때 이전부터 건물이 있었던 주춧돌과 장대석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전부터 이곳에는 경치가 아름다워 누구에 의해 건물을 짓고 풍류를 즐기고, 시를 읊고, 그림을 남겼을 것이다.
관동팔경 중 하나인 경포대는 지형적 가치가 뛰어난 자연 석호인 경포호와 어우러져 동해안의 빼어난 절승지로 시인묵객들에게 통제로 묶인 곳이 아닌 개방된 장소는 명사들의 많은 시서화가 살아났던 곳으로 경관적 가치는 비할 곳이 없었다.
조선 영조 22년(1746) 강원도 관찰사 김상성이 부임하여 화원들에게 강원도 절경을 그리게 한 후 친한 사람들에게 시를 지어 완성한 ‘관동십경’이 있다. 그 중 경포호와 경포대를 경계로 내호와 외호로 구분하였고, 호수에 낚시를 하는 노어부와 한가로이 날고 있는 갈매기를 그려 넣었다.
백사장과 죽도봉, 초당과 소나무, 봄날의 정취, 강문에서 떠오르는 일출, 바람에 미끄러지는 돛단배가 어우러져 있는 한 폭의 그림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적절하게 배합되어 경포호와 경포대는 천하의 절경지라 불렀다.
정철의 ‘관동별곡’에 경포대는 관동팔경 중 으뜸이라 하였으며, 경포대에 올라 달이 뜨는 밤이면 하늘, 바다, 호수, 술잔과 임의 눈동자에 각 하나의 달이 자리하고 있어 제일의 달맞이 명소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아름드리 소나무와 상수리나무가 푸름을 보여주고, 봄이면 벚나무가 화려하게 꽃을 피워 바람부는 한 낮이면 꽃잎이 날려 경포호에 떨어진다. 나무들과 어우러진 경포대는 옛 그림속의 경포가 아니다. 몇 그루의 소나무가 경포대와 어우러져 사방에서 보아도 볼 수 있었던 경포대는 40여 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는 한 청년의 생각이었으나, 오늘 이곳에 와 보니 옛 선비와 다름이 없다.
경포호를 바라보고 서 있는 경포대는 단층 겹처마 팔각지붕은 건물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원형초석 위에 48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졌다. 정면 5칸, 측면 5칸 규모의 건물은 사방이 트여있으며 마루를 높이 달았다.
호수를 바라보는 정면의 모서리에는 2층 누대를 꾸며 상좌의 자리를 만들어 입체면의 모양을 하고 있다. 앞뒤와 좌우 기둥머리에는 주심포형식의 공포를 배열하였다.
각 면의 마루 끝에는 계자난간을 둘렀고, 누대에는 머름난간을 둘렀다. 마루 좌우에는 마루로 오를 수 있도록 계단을 두었다. 이익공양식에 2고주 5량 가구이며,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창방과 장여 사이의 화반은 나비모양의 초화문을 그렸고, 측면의 하반은 둥근모양의 파련화를 그렸다.
창방, 장여, 도리에는 연화머리초를 한 모로단청을 하였고 대들보의 계풍에는 용을 장식하였다. 연등천장의 서까래는 푸른색의 가칠단청으로 하였고 판대대들보와 중보 사이에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肅宗御製(숙종어제)’라는 시제에 28자의 詩(시)가 적혀있다.
汀蘭岸芷繞西東(정란안지요서동) - 난초 지초 동과 서로 가지런히 감아돌고
十里煙霞映水中(십리연하영수중) - 십리 호수 물안개는 물속에도 비추이네
朝?夕陰千萬像(조일석음척만상) - 아침 안개 저녁 노을 천만가지 형상인데
臨風把酒興無窮(임풍파주흥무궁) - 바람결에 잔을 드니 흥겨움이 무궁하네
이 글은 숙종이 김홍도로 하여금 경포대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오게 하여 그 그림을 보고 글을 지었다고 한다.
율곡선생이 10세에 지은 "경포대부(鏡浦臺賦)"는 동심의 세계에서 사계절 경포대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봄에는 ‘유안(柳岸)의 실버들에는 연기가 노래하는 꾀꼬리 집을 봉쇄(封鎖)하고, 도원(桃源)의 꽃에는 이슬이 나는 나비 날개를 적시네.’ 여름에는 ‘그 여름철에는 축융(祝融)이 권세를 맡아 만물을 길러내면, 갖가지 초목들은 제대로 발육되고, 불같은 무더위는 극도로 치열해라.’ 가을에는 ‘창문엔 어적(漁笛) 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은 뿌연 먼지를 쓸어버리는가 하면, 드높은 하늘은 더욱 아득하고 흰 달은 더욱 휘영청하게 밝네.’ 겨울에는 ‘우주가 텅 비고 산천이 삭막한가 하면 먼 포구엔 오가는 돛단배가 끊어지고, 겹겹의 산봉우리엔 앙상한 돌이 드러나누나.’라고 하였다.
누대에는 많은 편액이 걸려있다. 주지번 또는 미불의 글씨로 알려진 ‘第一江山‘, 조하망의 상량문 ’盖聞霞崗福地 待石室而增名 銀浦靈區 得月宇而揚彩 至若彩蜃之噓氣<이하 생략>‘, 심언광이 관찰사로 부임하여 경포대에 앉아 시 한수를 지었다. ’芙蓉不獨古名城 芙蓉不獨古名城<이하 생략>‘ 유사눌도 이곳을 찾아 ’聞說奇觀我馬東 當年行樂畵圖中 如今直浴蘭舟去 臺上應無石澗翁‘의 시를 남겼다.
많은 묵객은 경포대에 오르면 한 수의 시를 남기지 않고는 이곳을 찾은 의미가 없었던 것 같다. 추녀아래의 전면에 있는 대호인 ‘鏡浦臺’의 해서편액은 이익회의 글씨로 전자편액은 유한지의 글씨로 알려져 있다.
조선 태조와 세조도 이곳을 찾아 사방을 둘러본 경치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내려다보이는 경포호(鏡浦)에는 갈매기만 오가고 푸른 하늘의 흰 구름만 오가고 있다. 한가롭게 뱃사공이 노를 저어가는 풍경은 수면 위로 가라 앉아 있다.
호 주변의 많은 누정과 경포 해수욕장, 주변의 빼곡히 우거진 소나무 숲, 호안의 수초 등이 어우러져 경포대의 화려한 단층은 더욱 아름다움에 젖어있다. 사람들이 경포대에 올라 경포호를 바라보고 있으면 군자의 마음으로 돌아간 다고 하여 군자호라고 부르기도 한다. 호수 가운데 찍혀있는 점 하나는 새들의 낙원이다. 각종 철새가 찾아오면 으레 새바위에 앉아 호반을 둘러보고 한 겨울을 지내다 떠난다.
예부터 경포에는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경포 8경’을 누군가에 의해 불러오고 있었다. 녹두정에서 동해의 일출을 바라보면 장엄하고 경이로운 풍경을 첫째로 꼽아 녹두일출(綠荳日出)이라 하였고, 동쪽 수평선 너머에서 솟아오르는 보름달의 달빛이 죽도의 대나무 사이를 뚫어 그 빛이 호수에 비칠 때 일어나는 그림 같은 장관을 둘째로 꼽아 죽도명월(竹島明月)이라 하였다.
달빛이 머문 경포대에서 강문 쪽 바다를 건너다보면, 오징어 잡는 고기배의 불빛이 마치 항구의 불빛처럼 휘황찬란하게 보이는데, 그 빛이 바다와 호수에 영도되는 아름다운 광경을 셋째로 꼽고 강문어화(江門漁火)라 하였고, 해가 서산마루 시루봉에 기우러질 무렵이면 집집마다 저녁을 짓는데 이때 가가호호 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노을에 물들어 평화로운 농촌을 연상케 하는데 그 평화로운 아름다움을 넷째로 꼽고 초당취연(草堂炊煙)이라 하였다.
꽃배에 임을 싣고 가야금에 흥을 돋우며 술 한 잔 기울이던 옛 선조들의 풍류정신을 회상하기 위한 기념으로서의 일경을 다섯 번째로 꼽고 홍장야우(紅粧夜雨)라 하였으며, 해가 서산마루에 기울어질 무렵이면 채운이 시루봉 북쪽 봉우리에서중봉낙조(甑峰落照) 경포 호수에 반영되는 일몰의 낙조가 잔물결에 부서지는 아름다운 광경을 여섯째로 하였다.
시루봉 상선에 신라 선인들이 풍류를 즐기며 바둑을 놓고 놀던 곳이 있었는데 고요한 날 밝은 밤이면 어디서부터인가 구슬픈 피리 소리가 바람결에 은은히 들려왔다 하여 일곱 번째로 꼽고 환선취적(喚仙吹笛)이라 하였으며, 경포대에서 바라보는 남쪽의 저 멀리에서 한송정에서 해질 무렵 치는 종소리가 경호의 잔물결을 타고 신선이 놀던 경포대까지 은은히 들려오던 옛 정취를 회상하며 여덟째로 꼽고 한송모종(寒松暮鍾)이라 하였다.
이렇게 경포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사람의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오래도록 잊지 못하고 다시 찾는 명승지이다. 지금도 경포대에 서면 월주(月舟), 월탑(月塔), 월파(月波)는 경포월삼이라 하여 천하의 장관을 간직하고 있다.
주변의 노송과 상수리나무, 벚나무의 아름다운 수형과 잘 어우러지는 경포대는 사계절 느껴오는 그 빛깔과 향기는 서로 다를 수는 있으나 경포호를 바라보며 시 한 수와 한 폭의 그림을 남기려는 생각은 같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참좋은인연신문사 &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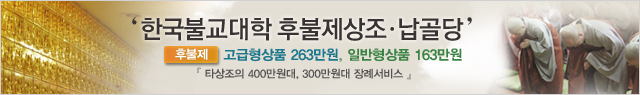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