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불교뉴스 |
 |
|
물살도 숨죽인 '청령포' 단종의 눈물로 싸여
2015.09.06 | 정진해 문화재전문기자

문화재 : 청령포(명승 제50호)
영월 청령포 관음송(천연기념물 제349호)
소재지 : 강원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7-1번지
동강이 내려와 서강을 만나면 남한강이 되고, 남한강은 북한강과 만나 한강이 된다. 다시 한강은 임진강을 만나 조강이 되었다가 서해의 바닷물로 소리 없이 사라진다. 이것이 노상군의 눈물이 담긴 물줄기가 아닌가?
한 나라의 왕의 세력에 이기지 못해 멀리 영월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갔어야 했던 그 장소에는 지금도 푸른 소나무는 바람에 부대끼며 깊은 속살로 피워내는 슬픔을 “우! 우!”로 강물에 띄운다.
작은 거룻배 하나만 있으면 쉽게 오가는 강폭... 없으면 창살 없는 감옥
영월로 가는 길은 무더운 여름날이다. 단종의 슬픔에 묻어난 서강의 물살에 비치는 그림자를 찾아 떠난다. 서강이 굽이 흐르는 강둑에 서서 강폭을 바라보고 있으면 금방이라도 건널 수 있는 감금의 땅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돌멩이와 소나무가 우거져 물과 자갈밭, 그리고 소나무밭으로 구분되어있다. 작은 거룻배 하나만 있으면 쉽게 오갈 수 있었던 강폭이지만, 쉽게 발을 내 딛을 수 없는 창살 없는 감옥이다.
관광지로 변화되면서 시설물과 서강을 오가는 동력선 거룻배 한 척이 물길을 가로 지른다. 자박자박 자갈들이 서로 부딪치는 소리는 단종의 눈물이 묻어있는 것이 아닐까? 배가 있어야만 건널 수 있는 곳, 섶다리를 놓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단종의 녹아내린 눈물이 흐르는 곳이어서 그림자로 그 맥을 끊을 수 없어 물살에 밀려가는 데로 거룻배가 넘나든다.
기계음과 함께 360도를 돌아 "부르릉“을 몇 번하면 도착하는 청령포의 자갈밭에 발을 놓는 순간 자갈 부딪치는 소리를 따라 솔밭으로 들어간다. 섬이 아닌 섬으로 불러야 할 담은 없지만 보이는 건 모두 담이다. 소나무밭, 자갈밭, 서강, 가파른 절벽이 모두 담이고 모두 감옥이다. 감옥을 지키는 경비병도 없는데도 삼엄한 위엄이 조여드는 자연 속의 감옥이다.
솔밭 속에 숨어있는 기와집 한 채와 초가집 한 채, 주변으로 다듬어 쌓은 석담, 기와집 마당에 비각과 허리를 굽은 소나무 한 그루를 보여준다.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의 싸움에서 밀려나 영월 주천을 거쳐 이곳 청령포에 유배된 단종, 그는 동·남·북 3면이 서강이 둘러싸고 서쪽으로는 험준한 암벽이 둘린 육육봉이 솟아있어 나룻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는 섬이 아닌 섬에 갇히게 되었다.
마을 사람의 숨소리마저 들을 수 없고 찾아오는 새들의 울음소리에 함께 눈물을 흘려야 했던 곳, 적막한 곳에서 외부와 단절된 유배생활은 하늘도 가만히 두지 않았다. 큰 홍수로 서강이 범람하여 청령포가 물에 잠기게 되자 영월 동헌의 객사인 관풍헌으로 처소를 옮겼었다.
단종이 떠난 자리에는 소나무만 우뚝 솟아 숲을 이루고 있었다. 단종이 이곳에서 유배생활을 할 당시에는 대청마루가 있는 전면 5칸 측면 2칸 반의 팔작지붕 형태의 건물이 있었고, 담을 하나 사이에 두고 밖에는 전면 5칸, 측면 2칸의 행랑채가 있었는데, 2002년에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따라 기와집과 초가집을 복원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건물 모습으로 복원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
마당에는 비각이 있고 그 내부에는 ‘단묘재본부시유지비(端廟在本府時遺址碑)‘가 세워져 있다. 이 비는 영조 39년 9월에 예조판서 이이 장릉을 봉심하고 돌아와 임금에게 보고할 때, 청령포는 곧 단종이 거처하던 곳인데, 담의 기초가 아직 있으나 가시덤불이 가려져 있으니, 행로를 가리키는 비석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아뢰었다. 영조는 이 이야기를 듣고 도신에게 명하여 비를 만들고 어필로 전면에 <端廟在本府時遺址碑>라는 여덟 글자를 새기고 측면에는 <皇命崇禎戊辰紀元後三癸未季秋泣涕敬書 令原營 石>이라 새겼다.
비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는 금표비가 세워져 있다. 이 또한 영조 2년에 일반 백성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세운 비이다. 사각의 비대 위에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돌을 얹었다. 비의 전면에는<淸泠浦禁標>, 뒷면에는 <東西三百尺 南北四百九十尺 此後泥生亦在當禁>, 측면에는 <崇禎 九十九年丙午十月 日 立>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청령포에서 동서로는 삼백 척을, 남북으로는 사백 구십 척 안에서 금표나 금송에 대한 채취 금지항목으로 일반인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로 세워놓은 비이다.
청령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서강이라 하지만, 유배지로 선정한 것은 아마 소나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름드리 소나무는 조선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나이는 들지 않았지만, 이 전에 이곳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관음송이 있다.
관음송의 나무는 나이가 600년 정도임을 추정하고 있다. 두 개의 가지가 서쪽과 동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서쪽의 가지는 비스듬히 누워 버팀목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동쪽의 가지는 곧게 자라고 있다. 보호목을 놓으면 금방이라도 밑에서 갈라져 원래의 모습을 읽을 것 같다. 단종이 이곳으로 유배 왔을 때 이미 소나무는 편안히 앉아 쉴 수 있었던 나이의 나무였다고 한다.
이곳에 걸터앉아 새들의 노래를 벗 삼아 한 나절을 보냈을 것 같다. 관음송이라 부르게 된 것도 단종이 흘렀던 눈물을 보았고,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볼 관(觀)’자를, 단종의 슬픈 말소리를 들었다 하여 ‘소리 음(音)’자를 따서 붙인 것이라고 하였다.
관음송은 옛일을 간직하고 있으나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 단종의 슬픈 마음이 구름에 보일까 봐 아름드리 줄기 중간에 가지를 뻗어 우산처럼 펼쳐 두었고, 하늘이 알게 된다면 더 큰 슬픔이 있을까 또다시 곧게 뻗어 가지를 펴고 푸른 하늘을 가렸다.
누구나 관음송 앞에 서면 눈의 높이를 하늘을 가린 가지와 푸른 잎을 본다. 주변의 많은 소나무는 모두 관음송을 향해 허리를 숙이고 가지를 뻗는다. 관음송에 걸터앉아 마음을 달래고, 한양에 두고 온 왕비 송씨를 생각하며 층암 절벽 위로 올라 흩어져 있는 작은 돌 하나하나에 그리움을 담아 쌓은 돌은 어느덧 돌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돌 탑 하나가 완성되면 그리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뜻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가파른 절벽 위에 올라서서 왔었던 그 길을 다시 보기 위해 섰던 망향탑은 오늘은 푸른 이끼로 물 들이고 있다. 절벽 아래 흐르는 서강의 물 흐름은 예과같이 단종이 무서워할 흐름이 아니다. 조용히 명경지수로 흐른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많은 물고기는 단종의 슬픔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해질 무렵 한양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겼던 노산대는 망향탑과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망향탑은 작은 돌 하나하나에 기다림을 담았다면, 노산대는 기다림을 깊은 서강에 묻어야 하는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더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볼 수만 있었다면 육육봉에 모두 올라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나 더는 오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노산대에서 마음에 쌓인 시름을 모두 내려놓아야 했던 곳이다.
지금은 관광을 위해 쉽게 오르내리도록 계단을 만들어 두었지만, 단종이 오르는 그 길은 무겁고 위협을 느낀 산길이었을 것이다. 이곳보다 더 잘 보이는 곳도 없고 더 멀리 보이는 곳도 없었다. 그저 육육봉에서 내려오는 산줄기 일부가 가파른 강물에 떨어지고 남은 바윗돌이 단종을 잠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 바위이다.
다시 만나는 청령포금표비는 다시 단종의 눈물이 빗어낸 자갈밭으로 내보낸다. 잔잔히 흐르는 서강의 투명한 물빛은 단종의 시름만큼이 깊어 보인다.
|
<ⓒ참좋은인연신문사 &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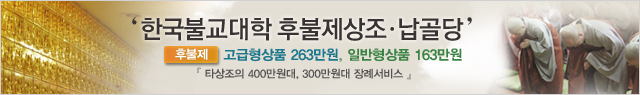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