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불교뉴스 |
 |
|
백제의 미소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불상’
2015.06.21 | 정진해 문화재전문기자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에 자리 잡고 있는 마애여래삼존불상은 고풍저수지 교차로에서 계곡 입구에 이르면 상황산과 수정봉 사이에 흐르는 냇물을 따라 가다보면 1400년 전의 백제의 미소로 알려진 마애여래삼존불상을 만나게 된다.
미처 삼존불상을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민간신앙으로 내려온 돌탑 위에 미륵불이면서 장승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강댕이 미륵불’을 만난다. 삼존상과 보원사지로 향하는 길목에 민간신앙이 어우러져 함께 공존의 대상물로 여겨오고 있다.
| ▲ 강댕이 미륵불 : 서해로 통하는 중국 사신들이 오가는 통로에 세워진 비보장승이라고 전해진다. ©정진해 |
|
장승은 마을의 질병, 사악한 무리로부터 안녕과 번영의 위한 기능을 갖는 것으로 서로 마주보거나 밖을 향해 보는데, 강댕이 미륵불은 안쪽을 향해 보고 있다. 어쩌면 용현계곡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으니 밖에서 사악한 무리가 물을 거슬러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보다 안쪽으로 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한다.
| ▲ 백제의 미소를 머금는 마애삼존불. 문화재명 :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국보 제84호) 소 재 지 :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2-10 ©정진해 |
|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웃는 모습 변해 놀라울 정도로 정교
고풍저수지에서 약 700m의 거리를 두고 있는 백제의 미소는 용현계곡에 흐르는 물처럼 시원하고 투명한 물빛이 초록색의 나뭇잎과 파란 하늘의 색깔처럼 잔잔한 미소로 인간의 미소를 끌어 들이는 것 같다. 방문객들이 백제의 미소를 만나고 계단을 내려오며 보여주는 미소는 평소에 지어보는 미소가 아닌 듯 감탄이 가득 담긴 표정이다.
용현계곡을 건너야 갈 수 있는 삼존불상으로 가는 계단이 있다. 다리를 건너는 것은 피안의 세계로 연결해 주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어쩌면 나무 계단은 자연과의 어우러짐에서 한 단계 낮은 길로 마음에 와 닿는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삼존불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돌과 돌의 만남이고 돌과 돌의 어우러짐이다. 한 계단씩 밟고 오르다 보면 금방이라도 방향을 잃고 용현계곡으로 떨어질 듯 한 용맹스러운 바위와 푸르게 피어나는 나무와 풀들이 옷을 입혀 노여움을 잠시 잠재우고 있는 듯 험악한 바위들의 부동자세는 안전한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배려가 아닌가 한다.
| ▲ 직사각형에 가까운 얼굴에 눈썹은 초승달 모양, 눈은 은행 씨 모양이고, 코는 얇고 넓으며, 입가에 미소는 부드럽고 푸근하다. ©정진해 |
|
오래전에 없었던 집 한 채에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다. 간략하게 꾸며진 삼존불의 해설 자료는 옛 그윽함과 오늘의 해맑은 빛으로 빼곡히 설명되어 있다. 다시 정형화된 계단을 따라 오르면 장군이라도 된 듯 한 높고 우람한 체구의 바위 한 면 작은 공간에 미소로 가득한 무언의 대화가 오래도록 오갔던 흔적을 읽는다.
처음 이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듯한 돌로 축대를 쌓아 놓은 곳이 아니었다. 약 20여 년 전에 이곳을 찾았을 때와는 많이 변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한때는 마애삼존불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보호각을 설치하였으나 문화재는 원래의 모습이 가장 자랑스러운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에 원래의 모습으로 철거를 하였다.
마애삼존불은 인암(印岩)이라 불리어지고 있는 바위에 새겼다. 마애불은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대다수이지만, 이 마애삼존불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계곡의 높은 곳이며 앞에 서야만 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았다.
| ▲ 우협시보살, 눈과 입을 통하여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다. ©정진해 |
|
당시 삼존불을 새길만한 유일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위험한 위치에 망치소리가 울러 퍼지면서 쉽게 다듬어 나가지 않을 것이다. 용현계곡을 지나는 사람들은 귓전에 망치소리를 듣지 못하였을 것이다. 오랫동안 다듬어 삼존불이 드러내는 그날까지, 아니 이후에도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의 기도처를 만든 석공이 아닐까 한다.
1,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조용히 숨어 있다가 1959년 4월에 처음 발견되었다. 마애삼존불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보원사터에 남아있는 유물조사를 위해 왔다가 발견한 홍사준이란 사람으로부터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마애불 중 가장 오래되고 또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지면서 빼어난 조각 솜씨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에는 여래입상, 오른쪽에는 반가사유상, 왼쪽에는 보살 입상을 배치하였다.
삼존에 나타난 고졸한 미소는 백제 불상의 특이면을 잘 보여준다. 이 삼존상은 석가불·미륵보살·제화갈라보살로, 《법화경》 사상이 백제 사회에 유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유물이다. 특히 금동미륵반가상이나 일본 코오류우지의 목조반가사유상, 호류지의 백제관음 등은 백제계 불상이라는 추정을 해왔었는데, 마애불의 발견으로 그 관련성이 드러났다.
| ▲ 좌협시보살, 반가사유상은 머리에는 관을 썼고 얼굴은 원만형으로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다. ©정진해 |
|
본존 여래입상 소발에 낮은 육계를 갖추었으며, 백호 흔적이 있다. 직사각형에 가까운 얼굴에 눈썹은 초승달 모양, 눈은 은행 씨 모양이고, 코는 얇고 넓으며, 입가에 미소는 부드럽고 푸근하다. 두광은 머리 바로 위에는 연화문을 두었고, 그 바깥에 원권문을 돌리고, 가장 바깥에 화염문을 장식했다. 그리고 작은 공간에 화불 3구를 새겼다.
오른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시무외인이요, 왼손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여원인이다. 법의는 통견이고 가슴에 옷의 띠 매듭이 있고, 옷주름은 U자형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며 무릎 아래까지 드리웠다. 발가락이 정면으로 드러나 있고, 발밑에는 단판의 복련연화좌를 조각하였다.
보살입상인 우협시보살은 머리에 일월식이 있는 높은 관을 쓰고 얼굴은 본존과 같이 살이 올라 있는데, 눈과 입을 통하여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다. 목에는 짧은 목걸이가 있고 두 손은 가슴 앞에서 보주를 잡고 있다. 천의는 두 팔을 거쳐 앞에서 U자형으로 늘어졌으나 교차되지는 않았다. 상체는 나형이고 하체의 법의는 발등까지 내려와 있다. 발밑에는 복련연화좌가 있고 머리 뒤에는 보주형 광배가 있는데, 중심에 연꽃이 있을 뿐 화염문은 없다.
좌협시보살인 반가사유상은 머리에는 관을 썼고 얼굴은 원만형으로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다. 상체는 나형이고 목에는 짧은 목걸이가 있고 허리 밑으로 내려온 옷자락에는 고식의 옷주름이 나 있다. 발밑에는 큰 꽃잎으로 나타낸 복련대좌가 있고 머리 뒤에 있는 큰 보주형 광배는 우협시보살의 광배 형식과 같다.
모두 밝은 미소를 짓고 있어 "백제의 미소"로 불리며, 특히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웃는 모습이 각기 변하는 특징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다. 석공의 망치소리가 멈춘 그날부터 미소로 또 다시 석공과의 인연은 오늘에 와서도 변함없음이 백제인의 넉넉한 마음까지 읽을 수 있다.
|
<ⓒ참좋은인연신문사 &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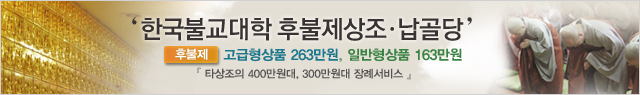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