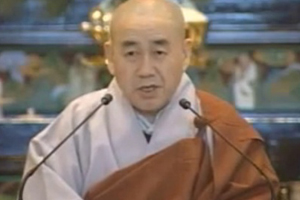
우리 인간은 속는 게 많다. 어디에 속느냐. 사랑에 속아서 애태우는 분 참 많다. 자식에 속아서 속상해 하는 분 굉장히 많다. 또 젊음에 속는다. 젊을 때는 젊음이 오래갈 줄 알고 생활하다가 젊음이 금방 지나갔음을 느낄 때 아주 괴로워한다. 그 다음 인생에 속는다. 한 해 한 해 살면서 내년에는 좀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하다가 20년, 30년이 지나도 좋아지는 게 없다.
인생에 속고 사는 사람들 인생을 인절미 7개에 비유한 비유경 말씀이 있다. 인절미 하나를 먹어보니 맛이 별로다. 다음 것은 더 맛있겠지 하고 먹지만 또 별로다. 그렇게 인절미 일곱 개를 다 먹었지만 별 맛이 없다. 인생이 이와 같다. 마지막 죽을 때 통곡만 남는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던고. 이 세상에 와서 한 게 무엇인고.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며 우는 거다. 사람은 이렇게 인생에 속는다. 속는 것 중에서 가장 고통스런 것은 자신의 생각에 속는 것이다. 남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한다. 옳다고 생각하고 행했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는다. 과거 통도사 인근 산에는 툭하면 불이 났다. 스님들과 산불을 끄고 오는데 산이 무척 넓었다. 기신론에 보면 마음 밖에 법이 없다. 일체가 심생(心生)이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왔다. 마음에 생기면 만법이 생기고[心生法生], 마음에 없으면 만법이 사라진다[心生法滅]. 산불을 끄고 내려오는데 ‘넓고 큰 산이 내 마음에서 나왔다는 말인가. 이상하다.’ 바로 이문제다. 자기 생각에 헤매고 속는다. 중생은 각지(覺知)로 살아간다. 견문각지(見聞覺知)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와 혀와 몸으로 느끼고, 의식으로 많은 것을 안다. 이걸 분별(分別)이라고 한다. 각지는 분별한다. 이건 산이다, 이건 몸이다, 이건 넓다, 작다 하는 이게 잘못된 거다. 순전히 자기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결과는 나빠졌다. 전부 자업자득이고, 자심자박이다. 중생은 자기 생각에 속는다. 생각대로 살면 결과가 좋아져야 하는데 나중에는 통곡뿐이다. 사랑에 속지 말자. 삼국유사에 꿈 얘기가 나온다. ‘사랑을 서로 굳게 언약했는데 회오리바람에 버들 솜처럼 날아가 버렸다.’ 버드나무 가지에 핀 솜이 얼마나 가벼운가. 이게 사랑의 약속이다. 사랑 따라갔다가 멍든 사람 많다. 젊음이란 무엇인가. 삼국사기 꿈 얘기를 보면 고운 얼굴, 예쁜 웃음이다. 이것은 풀끝의 이슬처럼 금방 사라진다. 사람들은 그걸 좇아가고 얽매인다.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다. 이런 데 속지 말고 옛 주인을 찾자. 우리 몸의 중심된 주인은 부모다. 또한 내 몸속에 있는 물도 내 몸의 주인이다. 뼈는 흙에서 온 것이고, 숨은 공기에서 오고, 체온은 불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나의 주인들은 전부 밖에서 온 것들이고, 이것들이 나의 현주인이다. 이것 다 빼면 나는 없다. 나의 본주인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해 나의 옛 주인이 나의 본주인이다. 옛 주인의 권고말씀이 있다. ‘해는 지고 저문 날에’ 해가 다 졌다. 인생이 늙어 세월이 얼마 안 남았다. ‘몸단장하고 어디를 가오.’ 사는 모습은 밖을 꾸미는 것뿐이다. ‘기쁨 좇아가시려거든 이내 한 말을 듣고 가오. 가는 곳은 꽃밭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재미에 빠져 산다. ‘나의 집은 연못이라. 꽃과 나비는 봄 한 철인데’ 기쁨 좇아가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순간이다. 봄 한 철이다. 우리의 본주인 찾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이 몸 본주인 찾아보고 죽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거다. 경봉 큰스님이 ‘주인공 문답’이라는 시를 지었다. ‘애달프다! 애달프다! 무정한 나의 주인공아. 지금에야 만났으니 어찌 그리 오래도록 늦었는가.’ 주인공이 대답한다. ‘우습다! 우습다! 내가 그대의 집 속에 있었건만, 내 눈이 밝지 못해 이렇게 늦었다네.’ 주인공을 찾았다는 말은 옛 주인, 이 몸의 본주인을 만났다는 말이다. 본주인을 어찌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만났느냐. 나의 집에 있었으나 눈이 밝지 못해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생각에는 본주인이 있다. 산을 볼 때도, 사람을 볼 때도 주인이 있다. 중생은 느끼고 알기만 할 뿐 거기에 주인이 있는 줄 모른다. 여기 가면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알고, 저기 가면 저렇게 느끼고 저렇게 안다. 만날 이 짓만 한다. 각지로만 헤매는 이게 생사윤회다. 본주인 찾는 노력- 몸 空함 아는 것 본주인 찾는 게 반야바라밀(분별과 집착이 끊어진 완전한 지혜를 성취함)이다. 반야(般若․온갖 분별과 망상에서 벗어나 존재의 참모습을 앎으로써 성불에 이르게 되는 마음의 작용)로서 본주인에게 가는 것이다. 바라밀은 간다는 말이고, 반야는 지혜다. 반야로서 본주인에게 어떻게 갈까. 반야심경에는 관세음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조견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춰 보고)하고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일체 고액을 건넜다)했다. 본주인 찾는 노력이 조견오온개공이다. 오온은 무리 몸이다. 우리 몸이 다 공함을 조견하는 것, 이게 반야바라밀이고, 이게 본주인 찾는 노력이다. 공은 시제법공상(是諸法空相․현상계의 본질적 차원)이다. 생겨났다 없어짐도 없고(不生不滅),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도 없으며(不垢不淨),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不增不減). 이 몸이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며, 부증불감임을 다 비춰보는 것이 반야바라밀행이다. 본주인 찾는 것이 조견(照見)이다. 딱, 비춰보는 것이다. 조견하면 된다. 비춰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보리살타(菩提薩埵․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다른 사람의 참된 이익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마음에 걸림이 없는 고로 일체의 두려움이 없어 뒤바뀐 몽상을 여의어 구경열반에 이른다. 반야 없는 보살은 없다. 보살은 전부 바라밀다를 실행하는 분들이다. 조견하는 사람들이다.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밀에서 나온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붓다의 깨달음은 위 없고 일체를 알며 바른 깨달음)를 무엇으로 얻는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얻는다. 조견하면 보살이 구경열반(究竟涅槃)을 얻고, 부처님이 무상보리(無上菩提․불타정각의 지혜)를 얻는다. 중생이 발심하여 조견수행하면 보살이 되고, 부처님이 된다. 어떻게 조견하나. 이 주인공이 말하기를 ‘내가 내 집에 있었다’고 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본주인이 있는 거다. 듣는 데 있고, 느끼는 데 있고, 분별하고 아는 데 다 있다. 있는데 밖으로만 좇아가서 헤맬 뿐이다. 이놈을 싹 돌이키면 된다. 돌이키는 이것이 본주인 찾기 신심, 보리심(菩提心․지혜를 구하는 마음)이다. 照見修行하면 보살되고, 부처님돼 보리심은 해는 지고 저문 날에 기쁨 좇아 돌아다니던 그 사람이 아, 나의 본주인을 찾아보자. 자기 본주인 찾기로 마음을 내는 것이다. 본주인을 찾으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그 실체를 봐야 한다. 그러려면 첫 번째 내 마음 되가져오기다. 내 마음을 도로 가져온다. 내 마음이 사방팔방에 가있다. 슬픔, 기쁨, 걱정은 내 마음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슬픔, 기쁨, 걱정을 안으로 거둬들여 버리라. 자기 마음을 되가져오는 것이 섭심내조(攝心內照)다. 마음을 거둬들여 안으로 본다. 마음을 가져오면 없다. 미움도 안으로 거둬들이면 깨끗해진다. 모두 대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강아지도 어머니보다 사랑을 더 쏟으면 어머니 죽음보다 더 슬프다. 슬픔은 자기 사랑과 애정에서 오는 것이다. 부모도 애정과 사랑이 없으면 죽어도 슬프지 않다. 내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 슬프니 거둬들이면 된다. 그리고 내 마음 되돌아보기가 있다. 자심반조(自心返照)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게 뭔가. 이것이 내 마음 되돌아보기다. 대상에 헤매고 떠돌아다니는 마음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이걸 실제화 시키면 내 마음을 내가 바라보게 된다. 누가 미울 때도 이 미운 마음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하냐. 준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일용공부다. 그렇게 되면 본주인과 내가 만나게 되는데, 그게 조달(照達)이다. 조견해서 맞닥트리는 경지다. 금강경의 무아법을 통달한다. 무아를 확실히 알면 나의 본 주인과 만난다. 그러면 사는 게 달라진다. 무아법을 통달한 보살은 근심걱정이 없다. 근심걱정은 받을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 받을 생각 하나 뚝 떼놓으면 근심걱정이 없다. 어떤 사람이 나를 떠나려고 해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무아법을 통달한 보살은 누가 자기 곁을 떠나려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안녕히 가십시오.’ 가는 사람 가게 하면 된다. 또 자기를 떠난 사람이 다시 오겠다고 하면 ‘어서 오십시오.’ 흐르는 물과 같다. 보살은 주기만 하지 받을 생각이 없다. 왜 주느냐. 줌으로써 내 지혜가 자꾸 넓어진다. 보시바라밀과 공덕바라밀은 남 잘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키우는 것이다. 공덕을 많이 쌓으면 내 지혜가 자꾸 넓어지고, 지혜가 넓어지면 나의 본주인과 만나서 구경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적조(寂照)다. 고요한 상태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런 삶이 정말 멋진 삶이다. 이 몸 죽기 전에 본주인 찾아서 1시간이라도 멋진 삶을 살아보고 죽자.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중요하다. 2012 <불교TV 특별법회> (녹취 및 정리: 김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