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불교뉴스 |
 |
|
내 집 찾지 못해 돌아올 수 없는 흥법사지 '승탑'
2015.04.14 | 정진해 문화재 전문기자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에 자리 잡았던 흥법사지는 남한강과 인접한 섬강 변에 있었던 사찰이다. 문막에서 안창대교를 건너면서 좌측의 영말들을 가로질러 깊숙이 들어서면 영봉산 자락이 아늑하게 감싸고 있고, 섬강이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삼층석탑과 비신이 없는 탑비의 귀부와 이수만이 남아 있어 옛 이곳에 사찰이 있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보여준다.
문화재명 : 원주 흥법사지(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5호)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보물 제463호)
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보물 제464호)
소 재 지 : 강원도 지정면 안창리 517-2
창건연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고려사>에 기록된 내용과 비에 새겨진 내용에 의하면, 통일신라 말기의 사찰로 추정하고 있다. 고려 시대에 융성했던 거돈사, 법천사와 함께 남한강 수계에 있으면서 원주의 3대 폐사지로 알려졌다.
흥법사는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의 스승이었던 충담(신라 경문왕 9, 869~ 고려 태조 23, 940) 스님이 구산선문 중 봉림산파에 소속되었으므로 선종사찰의 맥을 이어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충담의 속성은 김씨로 계림의 귀족 출신이다.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출가하여 장순선사의 제자가 되었다, 진성여왕 3년(889) 무주(경기도 광주)에서 구족계를 받고 법상부를 공부하였으며, 율장을 연구하였다. 당나라로 건너가 운계사 정원대사에게 수학하다가 귀국하였다.
고려 태조는 진공대사를 왕사로 임명하고 흥법사 중건을 지원하였다. 이때부터 흥법사는 흥법선원이 되고 선수행을 닦기 위해 찾아오는 스님들이 수백 명에 달하며 번창하게 됐다.
| ▲ 진공대사 탑비, 귀부와 이수만 남아 있고, 비신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 정진해 |
|
대사는 71세(937년)로 입적하니 태조는 진공이란 시호를 내렸고, 직접 비문을 짓고 최광윤이 당 태종의 글씨를 모아 탑비와 승탑을 세워 예우를 다 했다. 그러나 흥법사의 폐사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거돈사 법천사와 함께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절터의 건물지로 보이는 일부에는 가옥이 자리하고 탑과 탑비가 있는 공터는 일부만 제외하고 밭으로 활용되고 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섬강과 조망권이 확보되어 시원한 느낌을 받는 위치이다. 금당터로 보이는 석물 축대 부재와 건물의 주춧돌, 석등의 하대석뿐만 아니라 많은 기와 조각, 그릇파편 등이 흩어져 있다. 또한, 크고 작은 돌을 쌓아 만든 건물의 기단은 일부가 무너져 있다.
흥법사지(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5호)에는 진공대사탑비(보물 제463호) 귀부 및 이수, 흥법사지삼층석탑(보물 제464호)가 남아 있다. 이 문화재를 제외한 두 문화재가 또 있었다. 일제 강점기인 1931년 (전)원주 흥법사지 염거화상탑(국보 제104호)은 서울 탑골공원으로 옮겨지고, 진공대사탑 및 석관(보물 제365호)과 탑비의 비신은 일본으로 반출된 것을 되찾아 지금은 승탑 2기 모두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고, 비신은 4조각으로 깨어져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귀부와 이수만 남아 있는 진공대사탑비는 남서쪽을 향하고 있다. 여의주를 물고 있는 거북의 머리는 용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네발의 발톱은 5개로 대석을 힘 있게 딛고 있다. 특히 어금니가 매우 생생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거북 등에는 육각형의 귀갑문이 새겼고 안쪽에는 정만자인 卍자와 불교의 상징인 연꽃문양을 새겼다. 귀갑문 안에 卍자를 새겨 넣는다는 것은 자신의 의식과 영성을 상승시킨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비신을 세우는 비좌의 측면에는 연꽃 한 송이가 활짝 피어 있는 모양의 무늬를 새겼다.
이수는 구름 속에 6마리의 용이 구름 속에서 유영하는 모습을 매우 생동감 있고 힘차게 표현하였다. 금방이라도 튀어 나올 뜻이 머리를 치켜들고 있는 4마리는 위험을 주는 듯 한 느낌을 받는다. 중앙에는 전서체로 ‘眞空大師’라고 명기하였다.
| ▲ 삼층석탑, 지대석 위에 하대석과 받침돌의 면석은 하나의 돌로, 경사가 있는 4장의 널돌이 올려져 있다. 면석의 각 면에는 연꽃 측면문양을 3개씩 새기고 그 안에 화문을 돋을새김 하였다. © 정진해 |
|
석탑(보물 제464호)은 2층 받침돌 위에 3층의 몸돌과 지붕돌을 올린 전형적인 일반형 석탑이다. 지대석 위에 하대석과 받침돌의 면석은 하나의 돌로, 경사가 있는 4장의 널돌이 올려져 있다. 면석의 각 면에는 연꽃 측면문양을 3개씩 새기고 그 안에 화문을 돋을새김 하였다.
상대석의 높은 면석은 불규칙한 크기의 여러 장 널돌로 구성되었으며, 각 모서리에는 우주를 새기고 가운데는 탱주를 새겼다. 2장의 덮개돌은 평박하며, 탑신을 받치는 3단의 받침을 두었다. 상대석의 크기에 비해 1층 몸돌의 너비는 반으로 줄었고, 높이도 약 2/3로 줄었으며, 2층 이상의 몸돌 높이는 1층 몸돌에 비해 2/3로 줄었기 때문이다. 각 층의 몸돌에는 가느다란 우주를 모각하였다.
지붕돌은 추녀 부분이 많이 손상된 상태인데, 밑면 받침은 층마다 4단이고, 얕은 밑면 받침에 비해 윗면인 낙수면은 경사가 심하다. 추녀 밑은 전각에 이르러 약간의 반전을 보이며, 각 지붕돌의 꼭대기에는 1단의 각진 굄이 있다. 상륜부에는 심하게 손상된 노반만 남았다.
남한강 줄기에 자리 잡은 고려불교 중흥의 기반이 되었던 거돈사지 흥법사지 법천사지는 일제에 의해 원래 자리를 떠나있는 문화재를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아직 발굴 조사 및 정비사업이 중지된 흥법사지도 하루빨리 국가 차원에서 발굴한다면 더 이상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한다. |
<ⓒ참좋은인연신문사 &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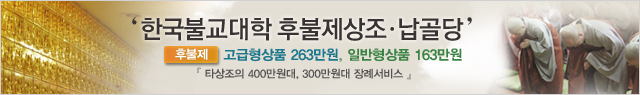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