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불교뉴스 |
 |
|
‘절을 불사르라 돈 줄게’ 유혹에 넘어간 승려
2015.03.21 | 정진해 문화재 전문기자

충북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청계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청룡사터, 이곳에는 아직 손길이 닿지 않는 절터에 파손된 기왓장과 절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릇 파편, 건물이 있었던 주춧돌과 기단 등이 흩어져 있다. 폐사된 절터 서쪽 구릉지에는 보각국사의 승탑과 비, 석등, 위전비 등이 남아 있다.
문화재명 : 청룡사 위전비(충북 유형문화재 제242호)
청룡사지 석종형승탑(충북 문화재자료 제54호)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앞 사자 석등(보물 제656호)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국보 제197호) 청룡사지 보각국사탑비(보물 제658호)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산 32
| ▲ 석재와 기와, 도자기 파편 등이 흩어져 있으며,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청룡사터, 발굴 조사가 시급하다 © 정진해 |
|
언제 누구에 의해 창건된 사찰인지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의 창건설화에 의하면, 도승이 비룡상천형(飛龍上天形)의 길지임을 확인하고 용의 꼬리에 해당되는 곳에 암자를 짓고 청룡사라는 편액을 달았다고 전한다.
청룡사지에 이르면 넓은 폐사지에 장대석으로 쌓은 기단과 자연석으로 쌓은 축대가 드러나 있다. 아직 발굴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많은 기와 파편이 흩어져 있다. 청량사가 폐허가 된 이유는 조선 말기에 판서 민대룡이 소실의 묘를 쓰려고 승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절을 불사르게 하였는데, 그 승려는 절을 불사르고 도망치다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 ▲ 사찰 경영을 위해 출원한 신도명, 출원품, 수량이 기록되어 있는 위전비(충북 유형문화재 제242호) © 정진해 |
|
청룡사지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청룡사위전비(충북유형문화재 제242호)는 청룡사의 살림이 어려울 때 신도들로부터 기증받은 전답의 내역, 이름, 품목, 수량 등을 기록한 비이다. 이 비는 귀부를 받침으로 하고 팔작지붕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귀부의 등에는 귀갑문을 새겼고 비좌는 연잎이 덮어있는 무늬를 새겼다.
귀부는 목을 곧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발가락이 5개로 머물러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지붕돌의 용마루는 이무기가 서로 마주보고, 각 내림마루는 구름 속에서 머리만 내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가첨석 일부가 파손되어 있고 비신에 새겨져 있는 글씨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 편이다. 이 비는 숙종 18년(1692)에 통정대부 숭휘(崇徽)가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 ▲ 조선 시대에 유행하던 전형적인 석종형 부도와 미완성의 승탑, 청룡사지 석종형승탑 (충북 문화재자료 제54호) © 정진해 |
|
위전비 뒤에 자리 잡은 석종형부도(충북문화재자료 제54호)와 미완성의 8각 승탑이 자리하고 있다. 방형의 석재 위에 8각의 연화문석과 운문석, 지붕돌이 차례로 올려있으며, 미완성의 몸돌은 사리공만 만들어진 채 옆에 놓여 있다.
석종형 승탑은 마치 간장독 모양이며 조선시대에 유행하던 승탑으로 특별한 조식이 없다. 상륜부에는 뚜껑이 덮어 있는 모양이며, 그 위의 부재는 남아 있지 않으며, 전면에 희미하게 ‘赤雲堂’이라 쓰여 있다.
석종형 승탑 뒤로는 고려 후기의 승려였던 보각국사를 기리는 석등, 승탑, 비가 있다. 혼수(混修:1320년)∼1392년)가 1392년(태조 1) 청룡사에 머물면서, 그해 9월 16일 유서를 남기고 입적하였다. 태조는 혼수에게 보각(普覺)이라는 시호와 정혜원융(定慧圓融)이라는 탑호를 내리고 절을 크게 중창하였다.
| ▲ 보각국사의 사자 석등(보물 제656호), 보각국사탑 (국보 제197호), 보각국사탑비(보물 제658호) © 정진해 |
|
보조국사 사자석등(보물 제656호)은 앙증맞은 사자 한 마리가 몸을 바짝 낮춰 석등을 떠받치고 있다. 이러한 석등은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형태로 지대석, 간주석, 상대석, 화사석, 지붕돌로 구성된 방형석등 형태를 따르고 있다.
조선 태조 3년(1394)에 세운 이 석등은 보각국사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웠다. 특이한 것은 납작 엎드려 있는 사자는 마치 두꺼비처럼 느껴진다. 등에는 좌우로 늘어뜨려진 장식이 조각되었다. 간주석 네 면에는 꽃이 피어있는 문양을 새겨 화려하면서 안정된 느낌을 준다. 사각의 화창 받침석에는 연꽃잎 여덟 장을 돌렸다.
화사석에는 앞뒤 두 군데에만 화창이 뚫렸고 네 모서리에 둥근 기둥이 조각되었다. 지붕돌은 아랫부분에 각진 받침이 한 단 있고 조금씩 들려올라간 처마 4귀퉁이에 서까래 모양이 표현되었다. 사모지붕돌은 두툼한 방석모습이며, 합각 용마루도 두툼하여 고려시대 지붕돌 양식을 잘 보여준다. 상륜부는 현재 없어진 모습으로 남아 있다.
보각국사 승탑(국보 제197호)는 배례석을 갖춘 팔각원당형 승탑이다. 승탑의 하대석 윗면에는 열여섯 장의 복련이 새겨졌으며 꽃잎마다 삼산형(三山型) 꽃이 장식되어 있다. 중대석은 북통 모양이며 8면에는 사각으로 구분하고 그 안에 운룡(雲龍)과 사자상이 번갈아 조각되었다. 상대석의 윗면에는 열여섯 장의 앙련을 새겼다. 몸돌은 팔각으로 배가 불러 있다.
각 면에 신장상이 조각되었고 기둥에는 반룡이 휘감는 배흘림기둥이 높은 부조로 새겨졌고 기둥 위에는 목조건축물처럼 창방이 표현되었다. 지붕돌은 두툼하며 처마는 몸돌의 기둥 위 창방머리와 닿은 부분이 역시 목조건축물의 짜임처럼 처리되었고 열여섯 장의 연꽃잎이 새겨졌다. 지붕돌 윗면은 경사가 급하고 합각마루 끝마다 봉황과 용머리가 차례로 조각되어 있다. 지붕돌 꼭대기에 일곱 장의 연꽃잎이 엎어 새겨졌고 그 위에 앙화, 복발, 화염보주로 이루어진 상륜부가 놓였다.
보각국사 부도비(보물 제658호)는 네모진 비좌 위에 머릿돌이 없는 비신이 서 있다. 비의 앞면에는 보각국사의 행장이, 뒷면에는 200여 명에 이르는 그의 문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앞면 아래쪽과 뒷면 위쪽이 파손되어 글자가 많이 마멸되었다. 이 비는 조선 태조 3년(1394) 문인선사 희달(希達)이 왕의 명을 받아 세운 것으로, 권근이 비문을 짓고, 승려 천택이 글씨를 썼다.
남한강 줄기에 자리 잡은 고달사, 거돈사, 법천사, 흥법사와 함께 조선말에 폐사된 청룡사 터는 발굴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절터에는 석재와 그릇 파편이 나뒹굴고 있다. 하루빨리 문화재 지정과 함께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좋은인연신문사 &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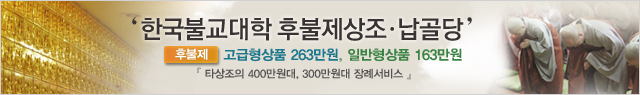 |
|
|
|